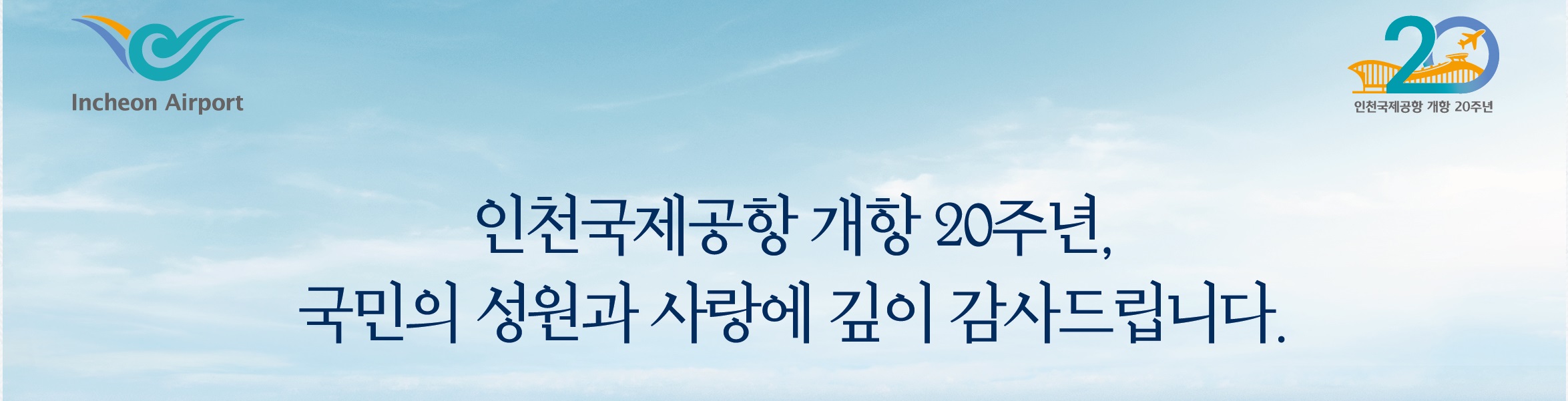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엄청난 사건이다. 한 인간이 생을 마감하는 것은 그에게는 종말이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는 공간상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인간관계의 절망이다.
탄생과 죽음은 인간의 속성으로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대사건이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은 죽음을 슬퍼한다. 감정을 지닌 동물이기에 이런 느낌을 갖고 삶과 죽음을 받아들인다.
혹시라도 불행하게 요절을 한다든지 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에도 슬픔은 마찬가지이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병사는 죽음을 전제로 한 대결을 펼치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각오로 피투성이가 되면서 까지 사투를 벌이게 된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도 이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인간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복수심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간이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잔인한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낯이 두꺼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백수를 누리면서 비교적 안락한 삶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탄이다.
그런가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 잘 살다간다고 긍정적으로 ‘잘 죽는다.’고 마지못해 애써 자위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이 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더 살고 싶고 영생불사(永生不死)하는 약이라도 있다면 당장 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진시황의 불로초(不老草)가 아니더라도 정력에 도움이 되고 장수에 좋다면 무슨 약이나 건강식품이라도 먹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공통된 감정이다. 죽음은 다 싫어하는 그리고 인간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필연적인 마지막 코스인 것이다.
그런데 불가의 스님들은 이런 죽음의 미학을 즐겁게 승화시키는 전통을 갖고 있다. 불교에서는 생사불이(生死不二)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본다. 죽고 사는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영겁(永劫)의 시간에서 본다면 죽고 사는 것은 반복되는 윤회전생의 한 순간적인 전환(轉換)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식론적 논리이다. 그렇지만 출가 스님들에게는 특히 선승들에게는 죽고 사는 일을 일상다반사(茶飯事) 같은 일로 생각한다.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출가사문에게 삶과 죽음이란 마치 하늘에 나타난 구름 한 조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백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찰나의 순간적인 눈 한번 깜박이는 것쯤으로 여기면서 영겁을 의식한다.
물론 모든 출가사문이 다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말 각고의 정진으로 수행을 하고 견성오도(見性悟道)한 도인의 경지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부처님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최고상태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무상사(無上士: 최상의 스승)가 된 다음, 45년간 길에서 살고 나무 아래서 자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자연스럽게 보낸 것은 다 이 같은 세속적 번뇌 망상을 여의고 생사 초탈의 열반적정(涅槃寂靜)의 경지에서 항상 머물렀기에 가능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면서 중국식 불교인 선종불교(禪宗佛敎)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명상선법(瞑想禪法)이 한반도에는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소개되었다.
한국불교는 중관유식(中觀唯識) 사상 위에 이런 선종불교의 격외도리(格外道理)를 추구하는 선불교 전통이 주류를 이루면서 독특한 선문화(禪文化)가 형성됐다. 《금강경》 《화엄경》 같은 수준 높은 불교철학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동양사상이 녹아있는 선법(禪法)이 크게 유행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전승되면서 선원(禪院)에서 명맥(命脈)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조계종이 선종불교의 전통과 맥을 그대로 계승하여 면면상속하고 있는데, 일 년에 두 차례씩 선원에서 하안거 동안거로 나눠서 3개월간 참선을 집중해서 한다. 선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8시간씩 좌선을 하는 것으로 일과를 삼고 있는데, 이런 수행은 참으로 힘들기 그지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수행정진으로 본다면 아마도 세계불교계를 망라해서 가장 힘든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불교가 참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토염불문(淨土念佛門)도 있고, 경학(經學)을 연마하여 혜안(慧眼)이 열리는 길도 있지만, 참선수행법은 경절문(徑截門)이라고 해서 수행할 때의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래면목(깨달음)을 터득하여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져 왔다. 고려시대 불일 보조국사로부터 이 수행법이 보편화하여 현재 한국불교의 선문(禪門)에서는 이 수행방법이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고도의 수련과정을 거쳐서 경지에 오른 고승들은 돌아가실 때를 당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적멸위락(寂滅爲樂:고요하여 없어짐을 즐김)의 놀이로 알아차리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의식을 오롯이 하여 육체가 불에 타더라도 의식을 놓아버리지 않고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원적(圓寂)에 든다고 표현한다. 육체의 사라짐이 아니라, 영겁회귀의 무한 속에서 영롱한 의식을 잃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승들은 이런 ‘죽음의 미학’을 앞두고 열반송이라는 임종게를 읊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3년 전 입적한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스님은;
“천방지축(天方地軸) 기고만장(氣高萬丈)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살다보니,
온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억!"
이런 열반송을 남기고 원적에 드셨다. 또 며칠 전 원적에 드신 봉암사 고우 선사는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주쇼”라고 지인께 당부했다.
이처럼 고승들은 죽음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경지이다. 조선시대 서산대사는 다음과 같은 열반의 노래를 읊었다.
“천 가지 계획 만 가지 생각
붉은 화로 속 한 점 눈송이
진흙 소가 물 위를 가나니
대지와 허공이 갈라지도다. “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일 것 같지만, 평생 동안 선문(禪門)에서 도를 닦으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날 이런 노래와 퍼포먼스로 자신의 지나온 수행경력을 발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승들을 사표(師表)로 삼아 존경하는 것이다.